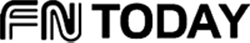"밥 먹어."
부엌에서 분주히 식기가 놓이는 소리가 멎자 하나가 거실을 향해 외쳤다. 조금 주저하는 행동거지로 하루는 거실로 향했다. 둘이 식탁을 맞대고 밥을 먹기 시작한다. 하나는 별 반응 없는 척 반찬을 젓가락으로 뒤적거리곤 은근슬쩍 말했다.
"여자애들이랑 같이 다니지마."
………? 의아해하며 하나를 바라본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라니……. 하나가 어이 없다는 듯이 되받아쳤다. 그에 대해 하루는 바로 입을 열려다가,
"아직 넌 이성친구를 사귈 나이도 안 됬을 뿐더러 그런… 연애라니 뭐니 하는 것에 벌써부터 관계하는 건 나중에 커서 좋은 어른이 될 수 없다고."
흥분한 듯 하루를 향해 말하는 하나에 의해 말문이 막혀버렸다.
"……뭐야, 그건…."
"그런 말 좀 하지마. 넌 그냥 이 누나한테 의지하면 그걸로 되는 거니까."
"뭣… 난 이제 어린애가 아닌라고!"
참지 못하고 하루가 소리쳤다. 콰-앙! 식탁을 세게 내리치고는 자리에서 일어선다. 하나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리곤 아무 말 없이 하루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하루는 생전 처음보는 누나의 모습에 크게 당황했다. 모른 체하고 부엌에서 걸어나가는 내내 하루는 하나의 따가운 시선을 느꼈다. 뭐라 하나가 중얼거린 느낌이 들은 하루였지만 무시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날씨 좋은 가을에 계속 방콕하고 있기는 뭐한 것 같아서 하루는 현관을 향했다. 신발을 갈아신을 때 누나가 어딜 갔나 생각해봤지만 아무렴 어떨까. 그대로 현관문을 열어젖혔다.
해변이 보이는 섬의 한조각을 보면서 느긋하게 걷는다. 생각 없이 이렇게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해변이 보이는 언덕길에서 하루는 그런 덧없는 생각을 했다. 미량의 바람이 불어 와 하루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자 하늘은 천천히… 노을져 갔다. 자연스레 눈이 감긴다.
"뭐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벤치에 앉는다. 엉덩이 부근에 그 무게가 전해져 왔기에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새삼스레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하루는 생각했다.
"하늘이 예쁘구나… 해서."
그래? 그녀가 말하고 잠시 대화가 끊어졌다. 잠깐의 공백이 생긴다.
"놀러 갈래요?"
그녀가 물어왔다.
"어디로?"
어디든 말이야, 그녀는 말하면서 하루의 손등에 손을 겹쳐 얹었다. 하루가 눈을 뜨고 살며시 고개를 돌린다.
"…………."
딱, 미래와 눈이 맞았다. 어? 하루는 머리가 멍해졌다. 미래… 라고?
"놀러 가요!"
미래가 일어서며 하루의 손을 이끈다. 잠…잠깐만! 소리칠 새도 없이 강한 힘에 의해 무게중심이 앞으로 크게 쏠렸다. 앉고 있는 벤치에서 튕겨 나가져 미래의 품에 안겨진다.
───하늘은 매우 푸르렀다. 그 동공은 노을지는 하늘을 담고 있다. 하루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
미래의 품에 안겨선 움직이지 않는 하루를 미래는 꽈악 끌어안았다.
"따라 와주세요."
미래의 집에 도착하고 나서 하루는 떡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집'이라는 단어보다는 '대저택'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집이었다.
"이게…네 집이야?"
"응. 안 돼?"
안 되기보다는 이런 섬에 저택이라는 게 존재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얼핏 보기만 해도 최소한 우리 학교의 10배다, 하루는 놀라워하며 생각했다.
미래는 담담히 고풍스러운 대문으로 걸어나갔다. 덜-컹, 저절로 문이 느릿하게 열리기 시작했다. 미래는 하루에게 들어오라며 손짓한다. 멍하니 생각에 빠져 있던 하루가 깨닫고는 주춤거리며 미래를 뒤따랐다.
"실…실례합…, 와……와…아."
안은 굉장했다. 문 앞에 서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 이 대저택은 문과 본 건물의 거리가 사백 미터는 되어 보였고 그 사이에는 화려한 정원과 달콤한 꿀냄새에 레몬향을 섞은 듯한 향기로운 냄새가 코를 간질였다.
"이쪽으로."
미래는 본 건물과는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미래가 도착한 곳은 어두컴컴한 지하실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었다. 그 바로 근처에 서서는 들어가자고 재촉한다. 매우 들어가기가 꺼려지는 하루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려 했지만 "그러지 말고 가자."라며 이번에도 미래가 손을 잡고 이끌었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됐다.
어둠을 거침 없이 뚫어가면서 하루는 점점 두려워졌다. 하루의 두 눈엔 그 무엇도 보이지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이지? 하루는 또 다시 의문을 품었다. 시력이 나쁘던 게 아니었어? …잠깐, 그러고 보니 평소에도 잘만 걸어 다녔잖아?
「자, 다왔습니다. 여기가 나의 놀이터.」
달--칵, 스위치가 켜지는 것과 같은 기계음과 함께 빛이 단번에 주위를 가득 메웠다. 베일에 쌓여 보이지 않았던 미래의 장난감들이 속속히 모습을 보인다. 하루는 그것을 눈동자에 넣고는- - -
"우……우…우웁,"
신랄한 냄새를 풍기는 위액을 바닥에 뱉어버렸다.
「……? 마음에 들지 않았나요? 그냥 장난감인데. 그래도 그 행동은 너무 심했는데요.」
장난감…이라니. 장난감? 언제부터 사람이라는 이름 대신 장난감이라는 우스꽝스러운 단어를 붙이게 된거지? 역시… 미래는 정상이 아니였어. 그날밤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이 미래라는 여자는 단단히 미친 정신병자라는 걸 지금에서야 알아 차리다니……!
저려오는 목젖과 메스꺼운 냄새가 하루를 자꾸만 자극했다. 한시라도 빨리 이곳에서 도망치라는 듯이. 찌릿찌릿 성대가 너무 아프다… 하루는 바닥에 쌓인 구토물을 보며 거친 숨을 내뱉었다.
「아니, 잠깐… 하루. 괜찮은 거예요?」
넌… 넌 대체 누구야, 미래? 어째서 몸 이곳저곳에 구멍이 뚫린 시체들을 장난감이라고 웃어넘길 수가 있는 거야? 왜 자꾸 나한테 간섭하는 거야……. 난 누나만 있으면 돼…. 누나, 누나가 보고싶어…. 누나 어딨어? 누나누나누나누나누나누나누나누나누나!!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건가,요,」
「하,루, 정신,을, 차,리,세요,」
───하늘은 매우 탁했다. 그 동공은 멸망하는 하늘을 담고 있다. 하루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