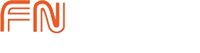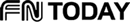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한다. 현대 사회에서 나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

이순신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명량'에서 마지막 전투를 치르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배 안에 있는 병사 가운데 한 명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렇게 개고생한 걸 후손들이 알까? 몰라주면 호로새끼들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순신 장군만 기억하고, 전투에 참여한 수많은 병사의 이름은 알지 못한다. 일등만 기억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가 보다. 만약 전투에 참여한 병사건 노를 저은 사람이건 그때 상황을 글로 남겼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13척으로 300여 척을 이긴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의 이름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기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12,162,041은 2019년 8월 기준 국립중앙도서관 장서 현황을 나타내는 숫자다. 단위는 '권'이다. 국내서가 8,664,052권, 외국서가 1,480,261권, 비도서가 1,736,285권, 고서가 281,443권이다. 천만 권이 넘는 책 중 내 이름으로 된 책이 단 한 권도 없다. 난 책을 읽다가 이 숫자―내가 실제 본 것은 2018년 6월 기준 11,534,517권이었다―를 보는 순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하는 한숨이 나왔다.

내가 글을 써 본 것이라고는 대학 다닐 때 과제로 낸 것과 회사에 들어와 작성한 서류가 전부다. 이런 글은 주관적인 감정이나 느낌이 들어갈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글은 내가 이 글에서 말하는 글쓰기와는 다르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글쓰기는 글을 쓰는 사람의 경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해서 글을 읽는 사람과 감정을 나누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내가 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글쓰기는 결코 책 읽기와는 또 다른 엄청난 내공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누구도 글을 쓸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유시민 작가는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유시민 지음, 생각의길)에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 독해력이 있어야 하고 독해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책 읽기밖에 방법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난 이 문장을 읽고 자신감을 얻었다. 앞으로 책 읽기를 더 많이 하면 독해력도 함께 더 좋아질 것이다. 그와 함께 계속 글 쓰는 연습을 하면 글 쓰는 실력도 더 올라가리라 믿는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