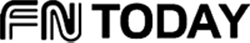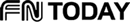성신여대 소설창작론 ‘작가의 탄생’팀은 미래의 예비 작가 양성을 위해 “나 혼자 쓴다 – 웹소설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웹소설 시대, 신춘문예의 계절 12월에 원고지대신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이번 테마는 ‘서울’. 서울이란 공간을 모티브로 서울에 사는 젊은이들의 삶과 사랑 그리고 희망을 쓰겠습니다.
윤애솔
엄마의 사망선고를 받은 지 벌써 이틀이 지난 후였다.
평생 어디 크게 아파본 적도 없던 엄마의 몸이 한순간에 피투성이였다. 아직도 그 덜덜 떨던 동생의 목소리가 생각나 눈을 질끈 감았다 다시 떴다. 언니, 엄마 사고 났대. 빨리 와야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정신없이 울먹이는 목소리에 커피가 가득 담겨 있던 머그를 떨궜었다. 그리고 회사에 바로 연차를 내고 달려간 병원에서 맞이한 건 뻣뻣하게 식은 엄마. 그때의 기분이 어땠던가.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
영원아, 밥은 먹었고? 문득 잡아오는 손에 놀라 앞을 보니 이름 모를 중년의 여자다. 나를 알았던가 싶어 차림을 살피니 한쪽 손에 십자가가 달린 성경책이 보인다. 엄마가 다니던 교회의 집사 중 한 명이리라 싶어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물기 어린 눈이 자꾸 내 손을 쓰다듬었다. 아이고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가…. 차마 말이 안 떨어지는 지 몇 번이고 되풀이되는 말이었다. 정말로 대꾸해 줄 힘이 없어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 외곽, 은평구 어디쯤, 빗길에 엄마가 몰던 차가 미끄러졌다고 했다. 그리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 그 상태가 심각했다고도 했다. 거기까지 듣고 토기가 올라와서 의사의 옷깃을 잡고 주저앉았었다. 엄마의 피투성이가 된 손이 앞에 보였다. 과녁을 잃은 원망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나뒹굴었다. 정신 못 차리고 울고 있던 동생과 얼굴을 감싸고 내내 아무 말 없던 아빠…. 거기까지 회상하다 다시 퍼뜩 고개를 들면 줄을 잇는 검은 사람들이 보인다.
싹싹하고 다정해서 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엄마의 빈소는 내내 젊고 나이 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고개를 조금 더 오른 쪽으로 돌리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고 있는 엄마의 사진이 보인다. 엄마 웃는 게 이렇게 허무해 보였던 적이 있었나. 갑작스러운 죽음에 유서 한 장 있을 리가 없었다. 덕분에 엄마의 죽음에 대한 원망은 다시 길을 잃고 거리를 떠돌며 악취를 풍길 뿐이었다. 그 거리엔 상실감만이 북적였다.
다시 고개를 떨궜다. 옆에서 동생이 손을 잡기에 마주잡았다. 화장품을 좋아해서 늘 꽃향기가 나던 손이 오늘은 버스럭거렸다. 차마 얼굴을 마주할 생각이 들질 않아 손만 만지작대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도치 않게, 두어 명 있던 조문객들의 시선이 와르르 쏟아졌다. 필시 어설픈 위로가 담겼을 거라고 괜히 속으로 화풀이를 하다 그만둔다.
“어디 가려고?”
“나 밖에 바람 좀 쐬고 올게.”
“지금? 밖에 추울 텐데?”
“아냐 금방 다녀 올 거야.
“….”
“그냥 밖에 앉아만 있다 올게.”
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두꺼운 패딩을 챙겨 준다. 아직도 울음이 가시지 않아 벌건 두 볼에 시선을 두었다가 이내 피했다. 내 모습이 저럴까 싶어 문득 입이 아렸다.
“추우니까 밖에서 공기 좀 쐬다 얼른 들어와….”
옷깃을 더 단단히 여며 준 동생이 퍽 다정한 투로 웅얼거렸다. 동생은 엄마의 사고 이후로 나와 아빠가 어디로 사라질지 모른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것 같았다. 불안한 손끝이 단추를 맴돌았다. 나는 다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아빠의 시선엔 그냥 눈을 두어 번 깜빡거리고 빈소를 나섰다. 상복을 입은 채로, 가방을 들고 꾸역꾸역 동정의 시선을 비집고 빠져 나왔다.
***
내 가방엔 아까 집에서 지갑이나 관련 서류를 챙길 때 같이 들고 나온 엄마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펑펑 울면서 그래도 엄마 생각이나 하면서 버티려고 챙겨왔었던가, 아니면 이것도 다 금방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아서 급하게 집어왔던가, 잘 기억나질 않는다. 잠깐 앉아 바람만 쐬다 들어갈 요량으로 장례식장 밖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엄마가 죽은 것도 안 믿기는데, 엄마의 죽음을 알리는 사람들의 시선은 아직 너무 버거웠다. 그렇지만 세 살이나 어린 여동생과 무뚝뚝한 아빠도 이와 다를 바 없으리라. 얼른 마음이나 추스르고 가야겠다 싶어서 가방에 든 엄마 물건들을 천천히 꺼내봤다.
엄마가 쓰던 불가리아 향수, 동생이 선물해준 엄마 인형, 엄마 손수건, 엄마 성경책…. 다 손때 묻고 먼지 쌓인 물건들이지만 엄마의 숨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꺼내놓고 몇 번 만지작거리기만 했는데도 코가 금방 시큰해져 가방에 도로 다시 넣으려던 찰나, 그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던 엄마의 일기장이 눈에 띄었다.
아무 무늬도 없는 표지에 덩그러니 ‘전정희’라고 쓰인 표지, 차르르 넘겨보았음에도 알아볼 수 있는 분명한 엄마 글씨. 엄마는 화장대 뒤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놨던 것 같았지만 사실 몇 개월 전 청소하다 발견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 그 때 분명 제자리에 뒀었는데, 오늘은 엄마 화장대 위, 다른 물건들과 함께 보란 듯이 곱게 놓여 있었다.
첫 페이지가 2012년 *월 **일…로 시작하는 일기는 엄마의 일기임이 분명했다. 몇 개월 전의 내가 엄마의 사적인 이야기는 굳이 훔쳐보고 싶지 않아, 다시 표지를 덮고 먼지투성이 화장대 뒤에 조용히 넣어두었던 바로 그 일기였다.
괜히 혹했다. 괜히 들고 나와선. 엄마가 표지도 없는 공책에 적어나갔을 소소한 생각들이 문득 궁금했다. 가족에 대한 얘기? 그것도 아니면 엄마가 다니는 학부모 모임 뭐 그런 얘기? 표지를 아무리 손가락으로 쓸어 봐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젠 다신 엄마 입으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여기 가득했다. 괜히 그 사실이 새삼스러워 또다시 딴 곳을 보며 눈물을 한번 훔쳤다.
침을 한번 꿀떡 삼켰다. 판도라의 상자가 내 손 안에 있었다. 엄마가 말해주지 않았을 법한 이야기들이 여기 있었다. ‘전정희’를 몇 번이고 쓸어보다가 이내 결심했다. 딱 한 장만 봐야지. 한 장만 보고 다시 넣어두고 엄마 발인날에 같이 보내 주리라 다짐했다.
전정희가 적힌 표지를 걷어내자 보이는 건 2012년 9월 10일 월요일의 일기였다. (다음회에 계속)
-작가 윤애솔-

파주완 전혀 상관없는, 소개할 것이 에버랜드밖에 없냐고 놀림 받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소설을 쓰게 된 건, 소설을 읽으면서 작가가 멋지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 멋지고 대단한 일을 따라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상 물정을 덜 경험해서인지 장래희망이 너무 많아, 적으면 원고지 열 장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편순이’ 일을 하면서는 ‘절대 서비스직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하루에 열 번씩 다짐하는 중입니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